Posted on 2025. 04. 17.
나랏빚 1,175조 원 역대 최대, 경제 활력 되살려 신용등급 강등만은 막아야
지난해 3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로 나랏빚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채무가 전년도 1,126조 8,000억 원보다 1년 새 48조 5,000억 원이나 늘어나면서 1,175조 2,000억 원으로 크게 불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의 척도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17년 연속 적자인 데다 적자 규모도 2020년(112조 원)과 2022년(117조 원)에 이어 세 번째로 100조 원을 넘겼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 2.4%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지난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2024년 국가채무는 1,175조 2,000억 원으로 전년도 1,126조 8,000억 원보다 1년 새 48조 5,000억 원(0.043%↑)이나 늘어났다. 이를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와 나눠보면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는 1,141조 2,000억 원으로 전년도 결산(1,092조 5,000억 원) 대비 48조 6,000억 원(0.044%↑)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지방정부 순채무는 34조 1,000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도 결산(34조 3,000억 원) 대비 2000억 원(0.006%↓)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4.1%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 5년 차와 겹치는 2022년 적자 규모 117조 원, 적자 비율 5% 이후 2년 만에 다시 100조 원, 4%를 넘어선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틈만 나면 줄곧 ‘건전재정’을 그토록 강조했었지만, 각종 감세정책에다 세수결손이 겹쳐 지난 정부와 차별화에 사실상 실패한 초라한 성적표만 남겼다.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달성하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임기 내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 전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을 비판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나랏빚은 200조 원 넘게 늘었다.
주먹구구식 예측으로 2023년 56조 4,000억 원에 이어 2024년에도 30조 8,000억 원이 예산보다 덜 걷히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2년째 이어지며 지난 2년간 무려 87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도 내수 부진에 대외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세입 여건 악화로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조기 대선을 통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나라 곳간이 비게 되면 당연히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4월 4일 국가채무 급증, 미국발 관세 충격 등을 이유로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18년 만에 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10월 프랑스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이 국가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하고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면서도 재정 적자 우려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데 이어서 지난해 12월 14일 AFP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프랑스의 ‘정치적 분열’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기존 Aa2에서 Aa3로 낮춘다고 밝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지난해 11월 29일 프랑스 신용등급을 ‘AA-’,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프랑스 내 정치적 분열이 심화하면서 재정 관리가 복잡해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들 나라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나랏빚이 빠르게 늘고 있고, 정치적 갈등이 극심한 데다 관세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한국으로선 결코 남의 나라 일로 간과할 일이 결단코 아니다.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는 일만은 근원적으로 막아야 한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정부와 기업의 차입 비용만 커지는 등 엄청난 국가적 손실로 자연스레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앞으로도 나랏빚인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재정준칙 법제화에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 미(未) 도입국은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2개국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기고 재정준칙의 법제화까지 추진했지만, 사실상 정권 유지 마지막 해엔 적자 비율이 전년보다 더 커졌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로,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 대선을 앞두고 이기적인 감세 요구와 선심성 국책사업 추진을 차단해야만 한다. 현실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입 기반은 점점 약해지는데 고령화 등으로 의무지출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제 활력을 되살려 세수를 확보하고 지출을 합리화해 어떻게든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일만은 원천봉쇄(源泉封鎖) 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발(發)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마당에 신용등급까지 하락한다면 그 후유증을 감당하기가 결단코 쉽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 때문이다.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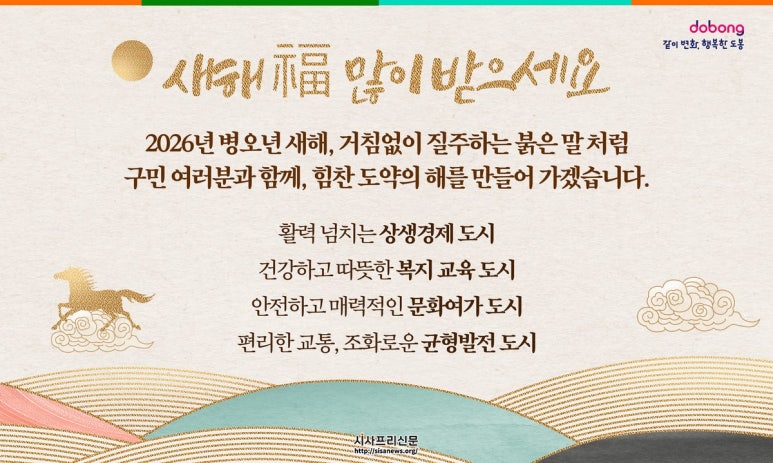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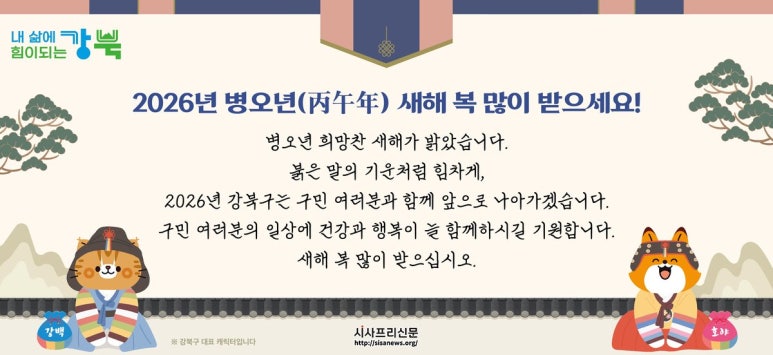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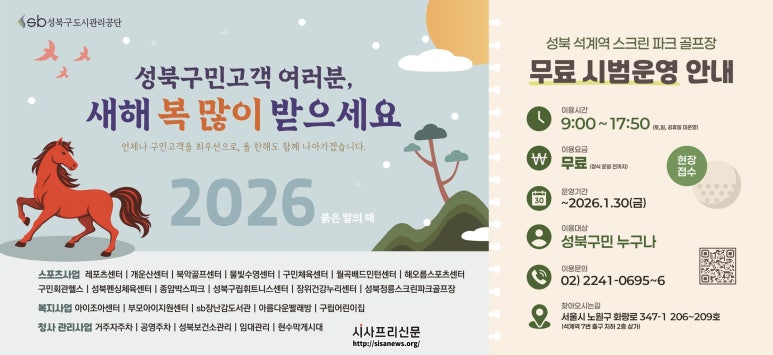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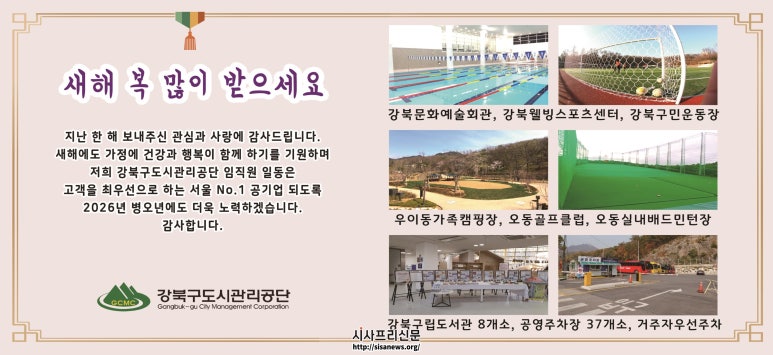
.jpg?type=w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