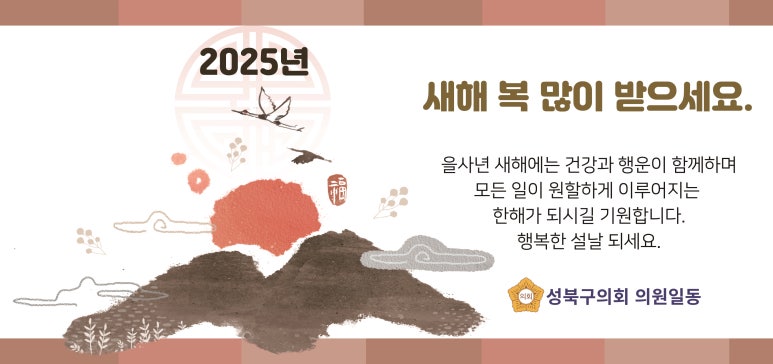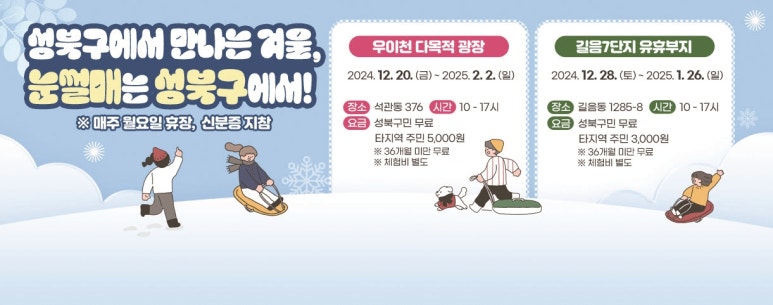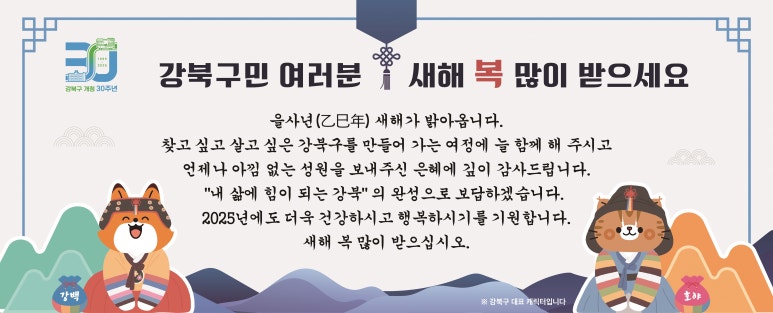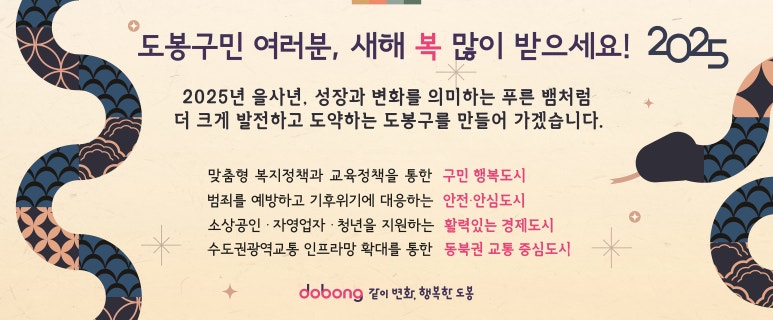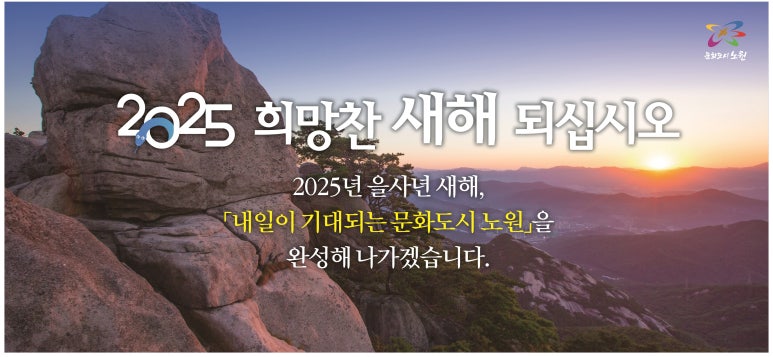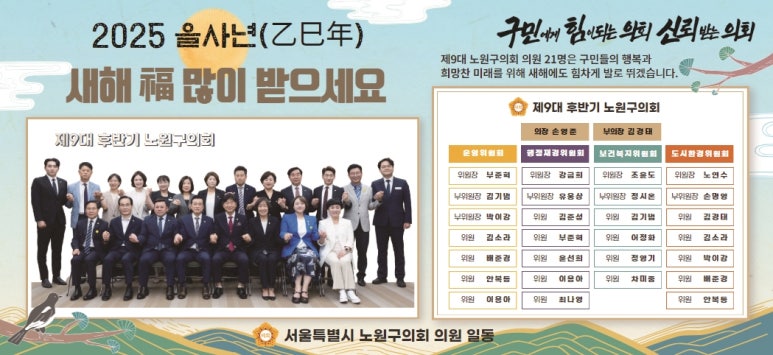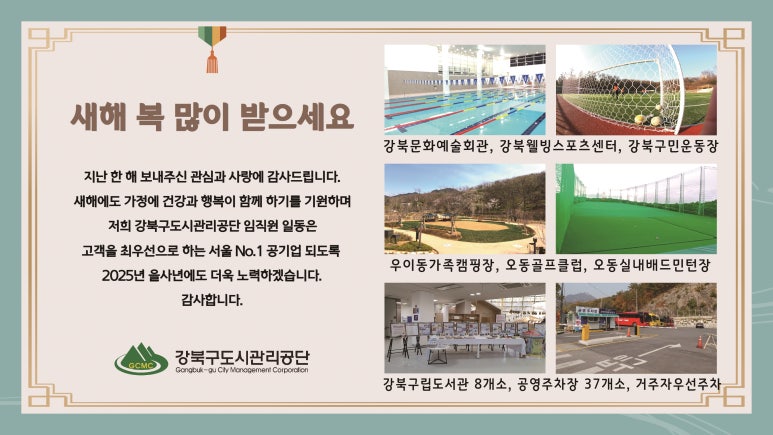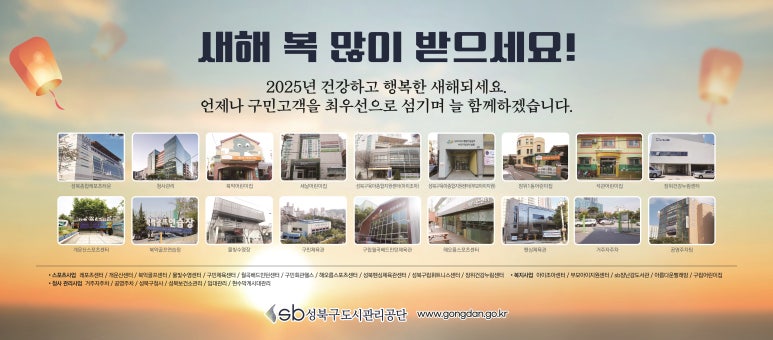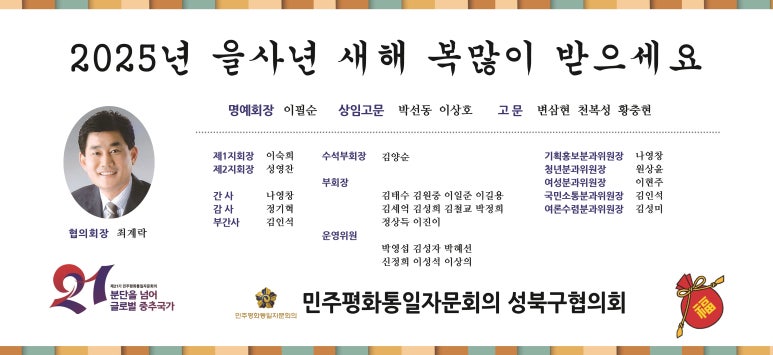Posted on 2020. 09. 17.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 대표 제안설명
가칭 ‘단설 우이유치원’ 전환 촉구 결의안 채택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이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가칭 ‘단설 우이유치원’ 전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대표발의에 나선 최미경 의원은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의 국가책임확대’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목표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며, 강북성북교육지원청의 1취학권역인 수유1·2동, 인수동, 우이동에 가칭 단설 우이유치원 건립을 준비했다”며 “공립 단설유치원이 지역에 생기는 것은 마땅히 환영해야 하겠지만, 유아시설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은 1취학권역의 영유아 아동수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대규모 단설유치원의 설립은 기존 유아교육, 보육시설의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청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그 결과로 지난 7월 23일 서울시 교육청은 당초 일반 8학급, 특수 2학급 총 176명 정원을 일반 7학급, 특수 3학급 총 150명으로 변경 발표하였지만, 이마저도 기존 유아교육, 보육시설에 영향을 줄 것이며, 장기적으로도 학급 수 유지가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규모이다”며 “일례로 지난해 경기도의회의 지적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관할 총 95개 공립 단설유치원 가운데 8개원 28개 반이 유휴교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릉시의 경우에도 2019년 당시 12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던 계획을 6학급 108명으로 조정한 바 있다. 아동의 놀이권은 UN의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당당한 권리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6차에 이르는 아동권리협약 이행평가 때마다 아동 놀이권 침해상황에 대해서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우려표명과 개선을 권고받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서도 2019년 개정 시 놀이시간의 확대와 바깥놀이의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러나 해마다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바깥놀이가 힘든 상황에서, 안전한 실내놀이터나 체험학습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임일 것이다. 안전한 환경의 유아체험학습시설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반영하여 부산에 체험학습시설과 전국 최초로 유아전용 실내수영장을 가진 공립 명지 허브유치원이, 서울 강서구에도 체험학습시설을 갖춘 공립 염강허브유치원이 신설될 예정이다”며 “서울시 교육청이 강북구의 유아들에게 제공해야할 새로운 시설이라면, 모든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고 미세먼지 등에 안전한 유아체험학습시설이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미경 의원은 “생존수영 등 유·초등 교육과정에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수영과정이 있지만, 강북구 관내에는 초등학교 중 화계초등학교 한 곳에만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다”며 “실내체험학습시설에 더하여 어린이전용 수영장을 교내 유휴공간에 설치하여, 강북구의 유·초등학생들이 꼭 필요한 수영교육을 관내에서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책임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미경 의원은 “공립 유아교육기관의 확대를 단순히 공립유치원을 설치하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공립 영유아 체험학습시설, 실내체육시설 설치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야 말로, ‘유아교육의 국가책임확대’라는 국정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며 “이에 서울시 강북구의회는 강북구의 지역여건에 맞는 공립유아교육시설 설치와 유아들의 안전하게 놀이할 권리 보장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나, 가칭 우이 단설유치원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유아 실내체험시설로 전환하여 인근 어린이집, 유치원 및 가정양육 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추후 공립유치원 신설은 철저한 수요조사와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교내 유휴 공간에 어린이전용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포함한 유아체험학습시설의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인근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들의 안전한 놀이권, 나아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