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09. 23.
수돗물 마시기, 환경보호의 첫걸음!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윤희 의원
지난 여름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이 가뭄으로 몸살을 앓았다.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식수조차 없어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까지 벌어졌다. 최악의 가뭄이 강원도에 닥친 것이다. 그 와중에 춘천시에서는 작은 분란이 있었다. 최악의 가뭄에도 춘천 외곽의 얼음공장에서는 하루 140톤의 지하수를 퍼 올려 식용 얼음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들은 하루에 몇 대씩 얼음을 실은 차량이 지나가는
걸 보며 분노했고, 마을에 얼음공장이 들어선 뒤 가뜩이나 물 부족 현상이 심해져 두렵기까지 하다고 했다.
식용 얼음뿐만 아니라 먹는 샘물의 원산지인 강원도에서는 이런 일이 몇 차례 있었다. 지난 2013년에는 평창의 먹는 샘물 공장 증설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을 우려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울산과 경남, 충남 지역에서도 먹는 샘물 업체와 지역 주민들 사이에 지하수 고갈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하수를 끌어올려 먹는 샘물을 생산하다보니 마을에서 쓸 수 있는 지하수가 고갈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먹는 샘물 업체는 지하 200~300미터 아래에서 지하수를 끌어오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다는 반응이다. 과연 그럴까?
세계적인 수자원 전문가인 피터 H. 글렉이 쓴 생수, 그 치명적 유혹 (추수밭, 2011)에 따르면 지하수가 고갈되면 지표수도 줄어들기 마련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2004년 미국 뉴햄프셔에서, 2005년 애리조나에서 벌어진 일을 소개한다. 실제 이곳에서는 먹는 샘물 업체가 지하수를 퍼 올린 결과 지표수가 말랐고, 지표수가 마르면서 습지에 사는 동식물이 죽는 등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리가 생수라고 부르는 먹는 샘물은 지하수다. 관정을 파고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려 페트병에 담아 파는 게 먹는 샘물이다. 물론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부합한다고는 하지만 그 관리 측면에서는 수돗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문제는 이렇게 관정을 파고 지하수를 끌어올려 먹는 샘물을 만들다보면 지하수 고갈의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관정을 팠다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2차, 3차 오염까지 불러올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먹는 샘물을 페트병에 담겨 유통되고 판매된다. 페트병 자체를 만드는 데 어머어마한 석유 자원이 쓰일 수밖에 없다. 피터 H. 글렉에 따르면 1리터 플라스틱 병 30개 정도를 만드는데 원유 3리터가 필요하고, 1리터 짜리 페트병 1개를 만드는 데 3~4리터의 물도 필요하다. 여기에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운반비용이 따로 든다. 생수병을 만드는 데 이렇게 많은 자원을 써야 하고, 유통비
용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다 페트병 재활용율이 낮다 보니 페트병 폐기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손쉽게 구입하는 생수가 환경오염과 에너지 낭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오염과 에너지 낭비를 줄이면서 바람직한 물을 소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바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피터 H. 글렉도 수돗물이 대안이라고 얘기한다.
일례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한강이라는 지표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하수 고갈과 오염의 문제가 없다. 페트병을 사용하지 않고, 매설된 상수도관을 통해 각 가정에 손쉽게 공급되기 때문에 자원 낭비의 문제점도 없다. 게다가 수돗물은 먹는 샘물보다 엄격한 수질기준에 의해 생산되고 공급된다. 먹는 샘물은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 59개 항목에 대해서만 수질검사가 이뤄지지만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164개의
수질검사를 통과해야만 공급할 수 있다. 그만큼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이다. 또 올해 7월부터 오존과 숯으로 한 번 더 거른 고도정수처리된 아리수가 각 가정에 공급되기 시작해 더 맛있어지고 깨끗해졌다. 상수도관도 거의 교체 완료했고, 주택 내 수도관도 계속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물탱크 관리도 더 엄격해졌고, 수돗물에서 염소냄새가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
먹는 샘물은 흔히 생수라 불린다. 미네랄이 많다고도 한다. 그래서 1만원을 호가하는 생수도 있다. 하지만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네랄 수치를 검사한 결과 국내산 생수의 미네랄 함량과 ‘아리수’의 미네랄 함량이 거의 비슷하다고 나왔다. 아리수의 수질이 결코 뒤지지 않다는 방증이다. 거기다 가격은 약 2,400배 정도 쌌다.
아리수를 마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마시는 일은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일이다. 가장 관리가 잘 된 물을 아주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물이 없지 않은가.
이제 한 번 아리수를 마셔볼 일이다.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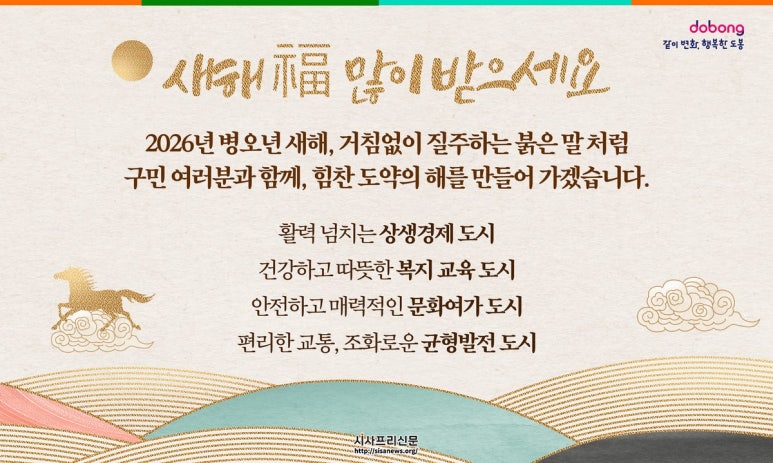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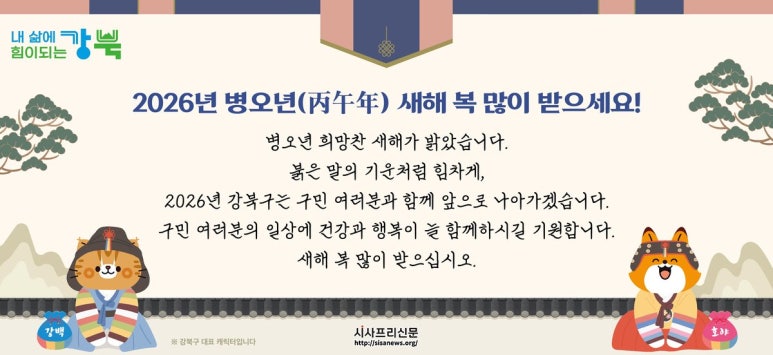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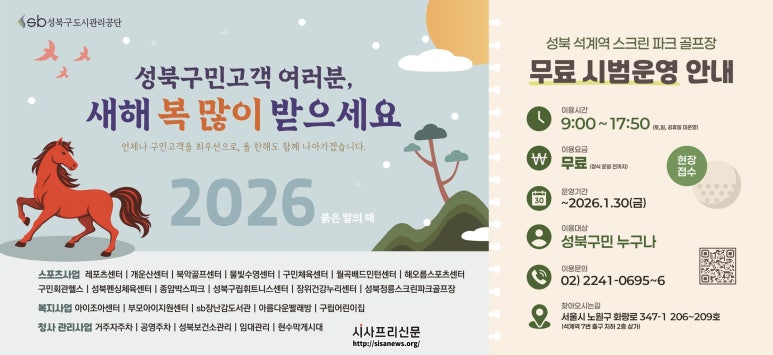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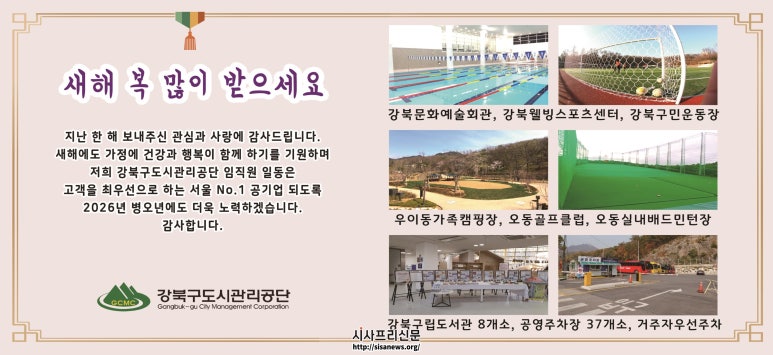
.jpg?type=w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