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04. 30.
6.25전쟁 개전 후 3일, 호국영웅들에 대한 재평가

서울북부보훈지청 보훈과 이강준
6. 25전쟁 개전 직후, 북한군은 T-34 전차로 대변되는 구 소련의 충분한 물량 지원과 그간 전투수행을 위해 준비한 병력을 기반으로 국군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결과 불과 3일만에 수도 서울을 함락시켰다. 북한군은 여세를 몰아 낙동강까지 전선을 남하시키는데 성공했지만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보급로가 차단되자 전황은 급반전되고 유엔군과 국군은 중공군이 개입하기 전 압록강까지 진군하는 압도적인 전과를 올리기에 이른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6.25전쟁에 대해서 익숙한 미장센이다. 북한군의 남침, 3일만에 서울 함락, 낙동강 전투, 인천상륙작전, 압록강까지 진격, 그리고 중공군의 개입이 그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간 아주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 개전 초기 서울이 함락되기 전까지의 3일, 그 3일 말이다. 보통 사람들은 북한군의 압도적인 전투력에 후퇴를 거듭한 국군이 3일만에 무기력하게 수도 서울을 내주고 고전하다가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반격을 개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꿔 생각해보면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서울에서 휴전선까지의 거리는 대략 50km. 최단거리를 상정하면 25km가량이 될만큼 가깝다. 현재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 2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다. 이정도 거리라면 6.25 당시라도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북한의 선봉 부대가 38선을 돌파해 서울까지 도착하는데 하루이상 소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군이 서울을 함락하는데는 3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곧 누군가가 파죽지세였던 북한군의 진격을 지연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에서 3일은 그야말로 천금과 같은 시간이다. 북한군의 서울 침공을 지연되고 있는 사이 한강 이남에는 한강방어선이 만들어졌고 수많은 병력과 민간인이 서울에서 탈출했다. 이렇게 구축된 한강방어선은 7월 4일까지 북한군을 저지하며 버텼다. 그 동안 유엔군의 파병이 결정되는 등 6.25전쟁의 중요한 단초가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3일은 어쩌면 인천상륙작전 이상으로 6.25전쟁의 전황을 바꾸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만일 더 빨리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다면 6.25전쟁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천금같은 3일을 그저 ‘무력하게 후퇴’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단 1초라도 더 버티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군인들과 이들을 돕던 민간인들, 미아리?창동지구 전투로 대표되는 이 민?군의 결사적인 항전이 잊혀지는 것은 후손으로서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창동방어선에서 최초 연대장 신분으로 전사한 함준호 준장, 중과부적의 상황에서 북한군 전차를 격파한 김한주 소령, 길음교일대에서 북한군 전차의 진격을 막기 위해 육탄공격을 감행하고 전사한 김순 대위, 치열한 교전 후 전선이 뚫리자 서울에서 홀로 유격전을 전개한 최민섭 대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숨져간 수많은 대한민국 군인들. 또한 이들을 위해 솥을 걸어 주먹밥을 만들어 보급하던 애국부인회와 수많은 조력자들. 우리는 미아리?창동지구 전투에서 희생된 수많은 호국영웅들에게 현재를 빚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미아리?창동지구 전투의 상징적 장소인 성북구 미아리 고개는 물론 미아리 창동지구 인근에는 당시 격렬했던 항쟁을 기억하기 위한 전승비 등이 거의 세워져 있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이분들의 노고와 공적을 바르게 평가하고 6.25당시 수도 서울을 사수하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단 1초라도 더 견디고자 했던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바르게 평가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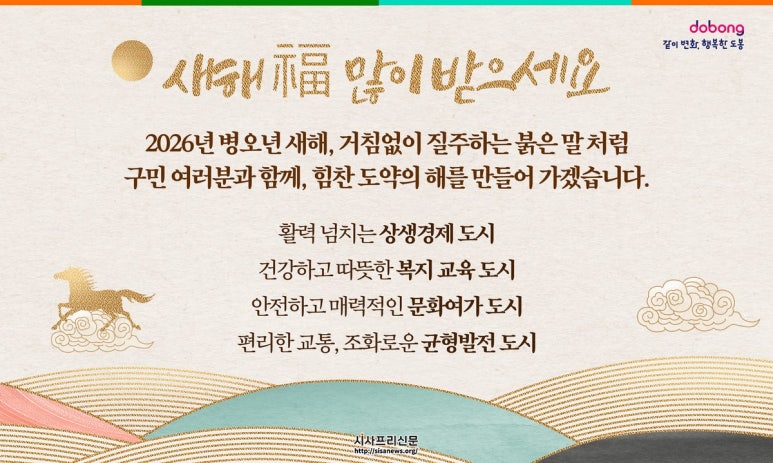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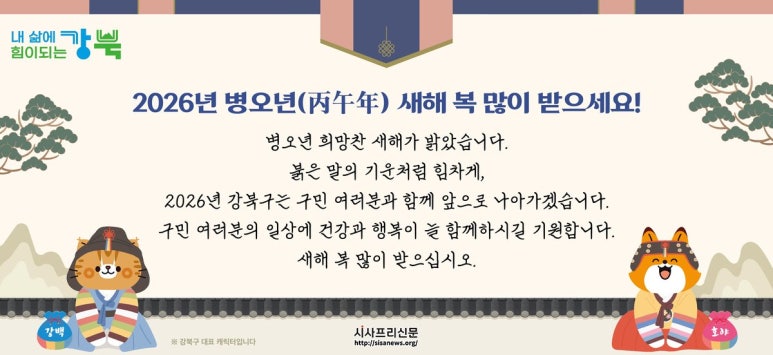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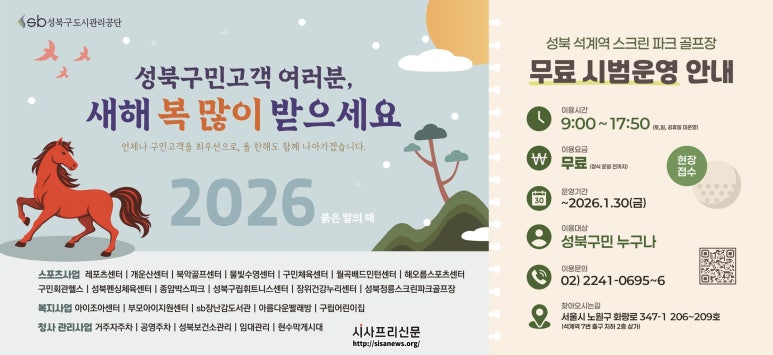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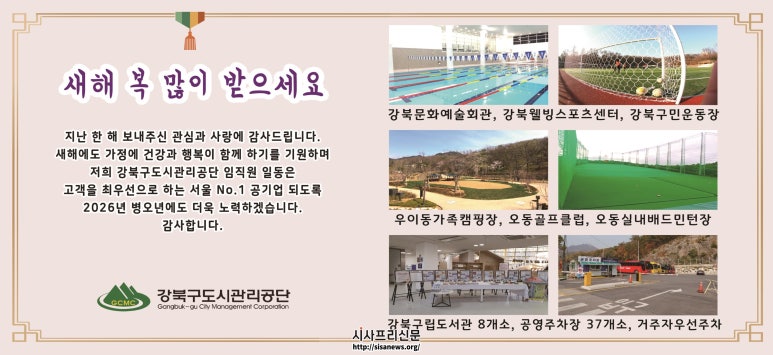
.jpg?type=w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