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03. 18.
소방대원의삶

노원소방서 한혜정
세월호 침몰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던 2014년, 그 여름이 끝나갈 무렵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혜정 구급대원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선아(가명) 엄마에요, 기억나세요?” ‘선아 엄마라... 선아 엄마가 누구지?’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생각이 나지 않았다. 잘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누구시냐고 다시 물었다. “몇 년 전 제 아이가 계곡 물에 빠졌을 때 구해주셨잖아요.” 아! 생각이 났다. 길지 않은 구급대원 생활을 하면서 딱 한 번 물에 빠진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적이 있었다. 2012년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출동 벨이 울리고 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신이 번쩍 났다. 사고 위치는 센터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다. 인접 구급대가 다른 출동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니 멀리 떨어진 우리 센터에 지령이 떨어진 것이었다. 사이렌을 켜고 마이크에 대고 ‘제발 비켜주세요’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고 도로를 달렸다. 현장에 도착하니 계곡의 평평한 바위 위에 작은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고 이미 도착한 구조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아이는 이미 자동제세동기도 반응하지 않는 심장 정지 상태였다. 아이에게 내가 해 줄 수 있는 거라고는 심폐소생술밖엔 없었고, 나는 마치 기계인 듯 움직였다. 병원으로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족히 한 시간은 된 듯 느껴졌다. 병원에 도착해 아이를 인계하고는 나와 응급실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미안했다. 그 어린아이를 온전히 살려서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게 너무나도 미안했다.
그때 그 아이는 병원에서도 아주 긴 심폐소생술 후에 심장만 돌아 왔고 의식은 회복되지 못한 채 더 큰 대학병원으로 전원 갔다 들었다. 아이 엄마에게 아이는 괜찮은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다. 그런 그 아이의 엄마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다.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정신을 차린 뒤 많이 늦은 안부를 물었다. 잘 지내고 계시냐고 선아는 잘 지내냐고 말이다. 어머니는 선아가 의식은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지만 살아났고, 휠체어에 앉을 수 있고, 눈을 깜빡이고 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 다른 또래아이들처럼 학교도 다니고, 재잘대며 하루를 얘기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갑자기 미안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처럼 느껴졌다. “죄송합니다.. 그때 제대로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축 쳐져있는 나의 목소리에 뜻밖에도 어머님은 “너무 고맙다”고 하셨다. 그리고는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 내 아이가 살아서 내 옆에 있을 수 있고,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을 수 있고,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을 이어 나가셨다. 어머니는 그 사고가 있던 날을 생각 하면 지금도 구급차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던 내 모습이 생각난다고 하셨다. 한 번 찾아가서 고맙다고 하고 싶었는데 항상 아이 옆에 있어야 해서 어려우셨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화를 드린다며 거듭 ‘아이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며 진심어린 마음을 전하셨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 여운이 남았다. 오랜만이었다. 구급활동을 하면 할수록 심장은 없고 기계적인 뇌만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다른 누군가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 무뎌지는 것이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는 위급한 상황을 자주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아픈 건 그냥 아픈 사람일 뿐이고, 죽어있는 사람들을 자주 보다 보면 한 사람의 죽음은 그냥 죽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되어버렸다.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웃긴 이야기라고 떠도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어떤 남자가 아주 예쁘고 여성스러운 간호사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했다. 그 백의천사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이 남자는 칼에 손을 베어 피를 흘리게 된다. 남자는 아내가 엄청 마음 아파하며 정성스레 치료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치료는커녕 ‘이런 걸로 안 죽어! 걱정 마!’라고 했다고 한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나에게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마치 그 아내 같았기 때문이다.
난 작년 한해 정말 아픈 곳이 많았다. 수술 중에 가장 쉽고 절개부위도 작다는 맹장 수술을 받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귀가 아플 때는 이러다 귀머거리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헛된 상상을 하며 괴로워했고, 주사바늘에 찔렸을 때는 전염병에 감염될까봐 잠복기 내내 마음을 졸여야 했다. 내가 아프고 나니 환자들의 고통이 보였다. 그들은 아팠고 두려웠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선아엄마의 전화를 받고나니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소중함을 넘어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지 다시 느끼게 되었다. 머리만 구급대원이 아닌 마음도 구급대원이 되어가는 것이다.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마음을 보듬는 구급대원이 되어가는 것이다. 어느 새 몇 년 전 아픈 사람을 모두 살리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가진 신임자의 내가 되어 있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비 응급 상황에서 무료 콜택시를 이용하듯 구급차를 부른다.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지치게 하는 일상들이 있다. 그 일상들 속에서 이런 작은 생각의 전환들이 나를 초심으로 이끌어 준다. 3월이지만 아직도 춥다. 이 봄이 더 춥고 아픈 사람들이 있다. 조금 더 치밀하고 세심하게 그들과 공감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마주하는 모든 환자들이 나로 인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길 바라본다.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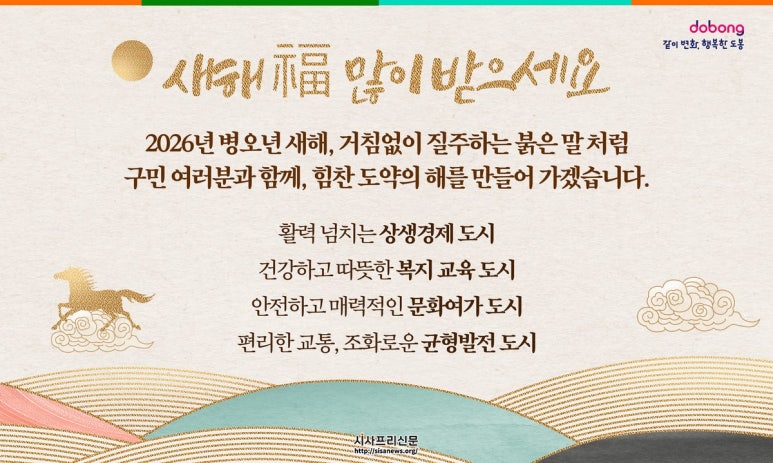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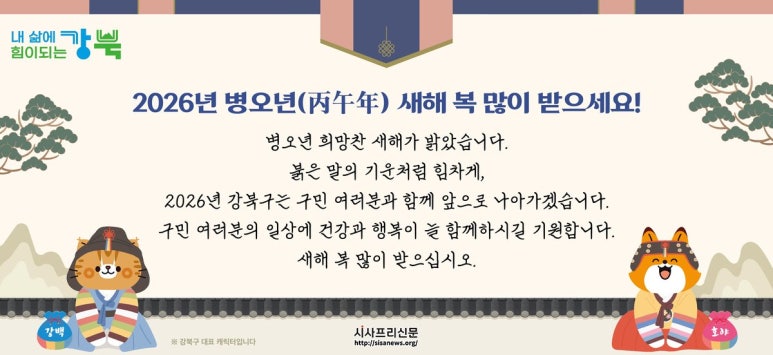






.jpg?type=w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