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12. 11.
생각의 향기

전 고대 안암병원장
고대 의대 김형규 교수
내가 재직하고 있는 의과대학에는 “생각의 향기“라는 강좌가 있다.
의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지만 학점은 없다.
“생각의 향기”는 세상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강사로 초빙된 분들 중에는 유명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살아내는 삶과 살아 온 삶의 무게에는 차이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도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 있었고 유명하지 않은 분들도 다르지 않다.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아름답게 이겨낸 분들의 이야기는 어떤 향기보다 향기롭다. 그중 한분의 이야기다.
아버님을 시각장애인으로 둔 따님의 이야기다.
시각장애인이시던 아버님은 평생을 한국형점자에 매달리셨다고 한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여러 나라에서 들어온 점자가 혼용되고 있어 점자를 통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어렸을 때는 아버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도 했지만 지금은 그 일을 이어 받아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 분의 얘기에 주목 한 것은 그 다음 이야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은 시각대신 청각이 대단히 예민해서 남들이 못 듣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여기저기서 하는 애기를 구별해 어느 곳에 어떤 장사가 있는지를
안다는 것이다. 언어장애인은 시각이 예민해서 스쳐지나가는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고 했다. 무슨 옷을 입었는지 옷은 무슨 색인지 간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모두 구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애인의 이런 특별한 능력보다는 장애를 이유로 기피하거나 취업을 거부 한다고 아쉬워했다,
사람들의 부러워하는 특별한 능력도 어떻게 보면 다른 이름의 장애일 수도 있지 않을까?
장애가 다른 특별함처럼 말이다.
사회가 소란하고 시끄럽다. 너와 나를 가르고 너의 잘못과 나의 잘못을 다툰다.
그렇지만 사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향기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유지 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내년이 기다려진다.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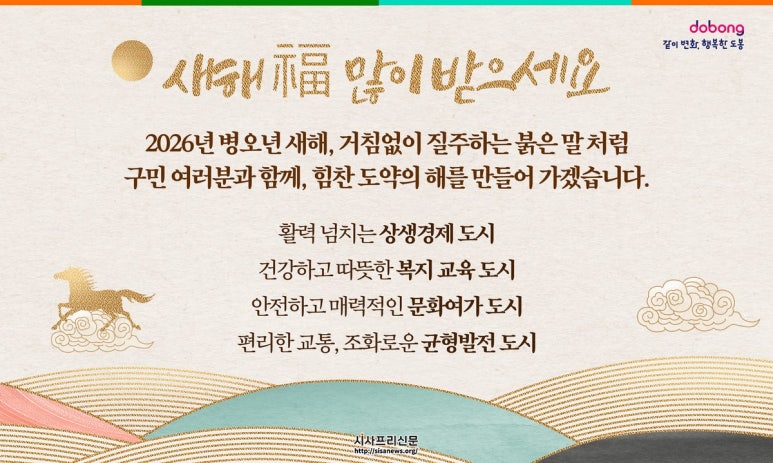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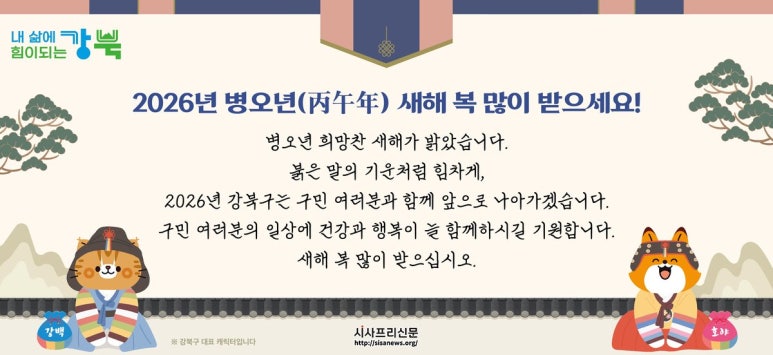






.jpg?type=w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