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11. 26.
연평도 포격 도발 3주기를 맞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 강 성 만
연평도는 서해 5도중 하나로 인천에서 서북방으로 122km 위치에 있으며, 대연평도와 소연평도로 이루어져 있다. 450여 세대가 거주하며 꽃게잡이로 유명한 작고 아름다운 섬이다.
그러나 연평도는 북한과 불과 3.4km거리로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백령도와 함께 서해상에서의 북한군의 활동을 감시하고 서해 NLL 일대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함정을 지원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평소 평화로워 보이는 모습과 달리 연평도는 백령도와 함께 북한과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북한에 노출되어 항상 북한의 도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평시의 평화로움 뒤에는 언제 발발할 지 모르는 북한의 위협이 상존해 있는 것이다.
연평도 해역은 6.25전쟁이후 남북한 해군 함정의 최초 교전이었던 1996년 6월의 제1연평해전, 25명의 사상자가 있었던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등 종종 남과 북의 군사적 대립이 상존하는 곳이다. 특히 2010년 11월에 있었던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은 1953년 7월 휴전협정이래 민간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군사 공격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2010년 11월 23일 아침 10시 15분부터 연평부대의 K-9 자주포 해상사격 훈련도중 오후 2시 34분 북한은 기습적으로 방사포 170여발을 연평도 민간시설을 포함한 군부대시설에 무차별 포격 도발을 감행하였다. 연평부대는 즉각적인 대응사격으로 총 80여발의 대응사격을 하였으며, 이 교전으로 해병대 연평부대 故 서정우 하사와 故병 문광욱 일병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군부대 공사중인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다.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은 사망·부상자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었다. 당시 연평도에 있던 주민들은 날아오는 포탄에 집이 불타는 것을 목격했고, 해군 함정을 타고 연평도를 빠져나와 피난을 가는 등 전쟁의 실상을 경험했다. 한달여 만에 돌아온 삶의 터전은 불타 있었고, 주민들은 심리적 불안과 우울, 불면 등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 외연적으로는 전쟁에 비할 수 없겠지만 주민들에게 연평도 포격도발은 전쟁과도 같은 날벼락이었다.
한국전쟁이 멈춘지 60년, 이제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조차 잊고 살고 있다. 또한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도발은 우리에게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북한의 작은 도발일 뿐이라는 익숙해진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국토가,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당한 중대한 도발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토 끝자락 그 어디라도 감히 북한이 넘볼 수 없도록 철통같은 경계태세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연평도 포격도발 3주기를 맞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에 감사하며, 이를 위해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전쟁의 아픔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보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철저한 안보의식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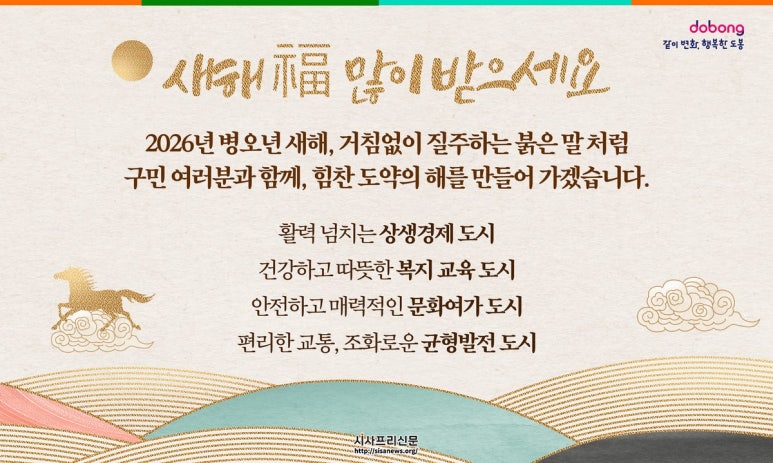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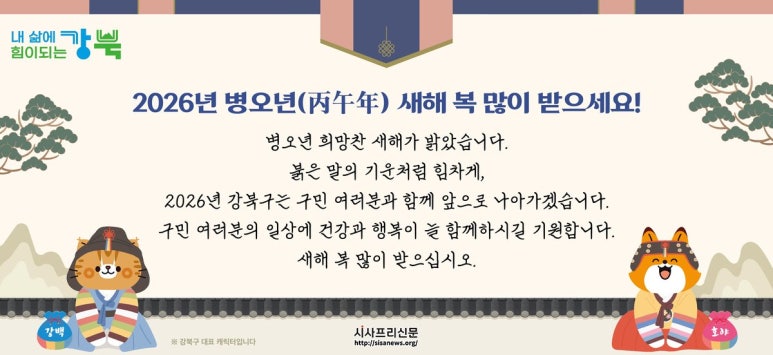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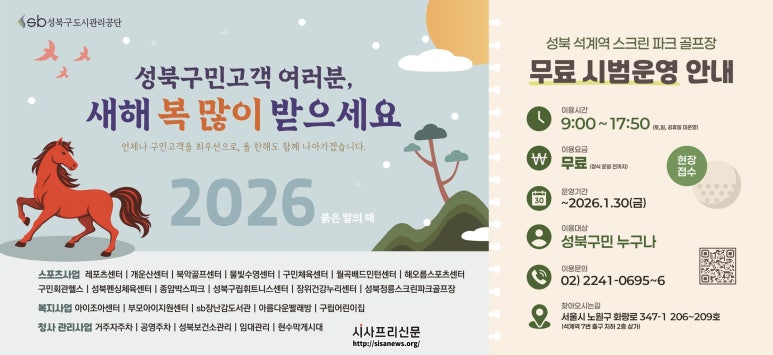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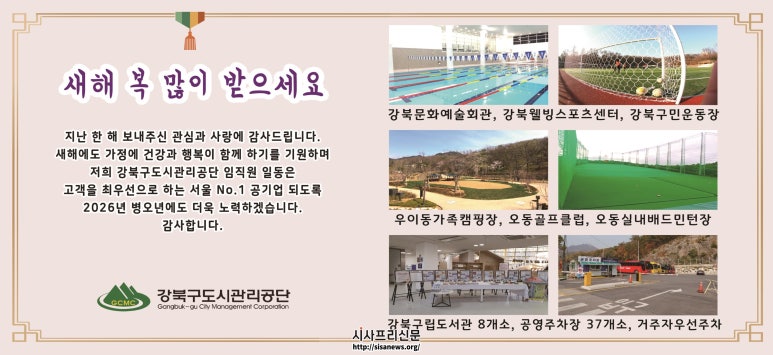
.jpg?type=w773)